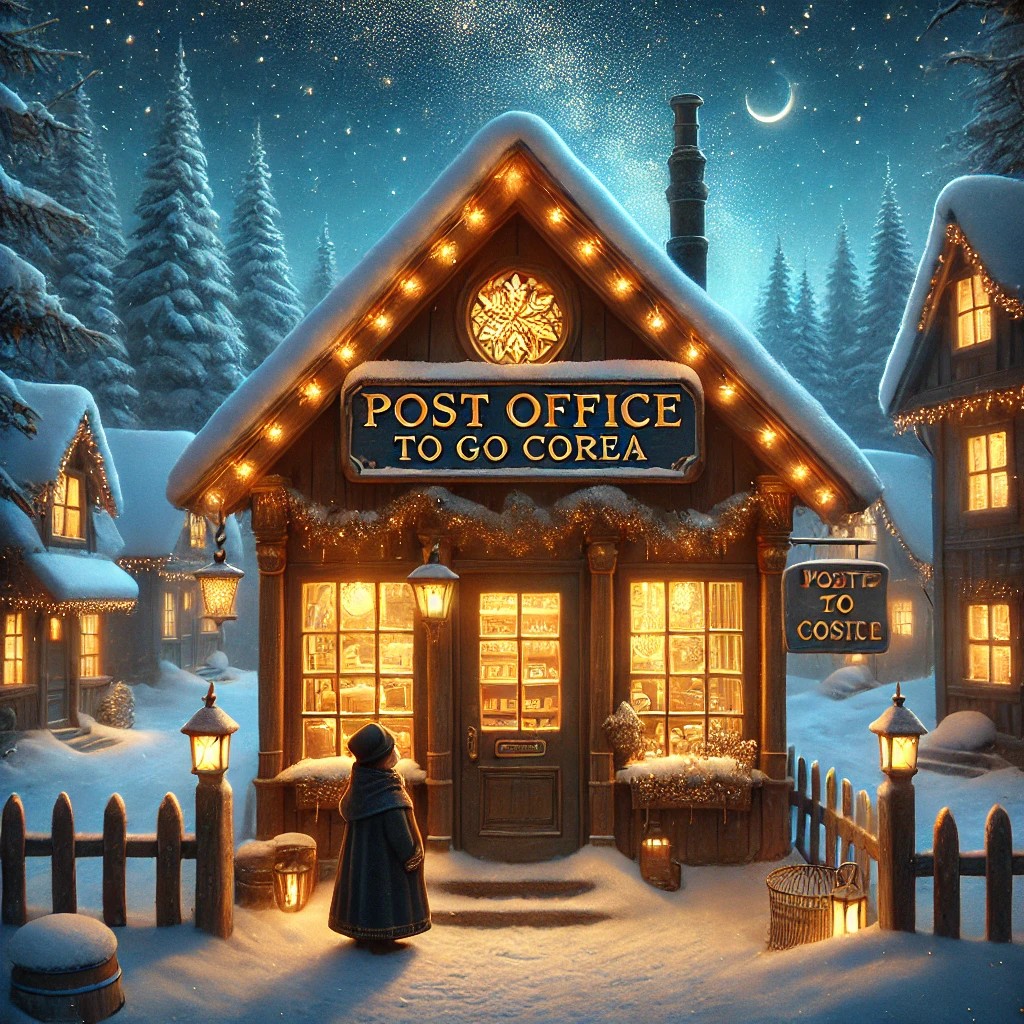#1
스물여덟 민지에게 할머니는 언제나 부엌 한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기억되었다. 특히 마을 잔치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할머니표 된장찌개는 그 자체로 축복이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 뭔가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는 듯한 그 찌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누구도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하는 전설 같은 음식이 되어버렸다.
엄마도, 이모도, 심지어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반찬가게 아주머니조차 “아이고, 네 할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지. 그 양반은 손끝에 뭐가 달렸나벼.” 하고 혀를 내두를 뿐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할머니의 기일이 다가오자, 민지는 문득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그 된장찌개 맛이 간절해졌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찌개를 먹은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희미해진 맛을 떠올리려 애쓰며, 민지는 어쩌면 무모할지도 모르는 결심을 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되살려 보기로.

#2
시작은 막막했다.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기에 남겨진 레시피 같은 건 당연히 없었다. 민지는 먼저 할머니의 낡은 살림살이가 보관된 창고부터 뒤졌다. 먼지 쌓인 찬장 구석에서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지만, 수첩에는 알아보기 힘든 기호 같은 그림 몇 개와 날짜들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실망한 민지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할머니와 가장 친했던 옆집 박 씨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 혹시 우리 할머니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셨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민지의 물음에 박 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다… 워낙 손이 빨라서 옆에서 봐도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꼭 뒷마당 장독대에서 뭘 한 움큼씩 퍼 넣던데… 그게 뭐였을까?”
희미한 실마리를 얻은 민지는 다음으로 마을 정미소 김 씨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늘 정미소에서 직접 빻은 고춧가루만 고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집 고춧가루는 맵기만 하다고, 꼭 여기서 빻은 태양초를 쓰셨지. 그래야 칼칼하면서도 단맛이 난다고.”
또 다른 이웃인 떡집 최 씨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멸치 육수를 낼 때 꼭 말린 표고버섯 밑동을 함께 넣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비린내 잡는다고 그랬나? 암튼 그게 들어가야 국물 맛이 깊어진다고 귀띔해주시더라고.”
민지는 마치 탐정처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기억의 조각들을 모았다. 뒷마당 장독대의 무언가, 직접 빻은 태양초 고춧가루, 표고버섯 밑동… 조각들은 제각각이었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직접 담근 집된장만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다른 날은 시판 된장과 섞어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어른들은 저마다의 기억 속 할머니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민지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민지는 할머니의 된장찌개 레시피뿐만 아니라, 잊고 지냈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추억들을 함께 얻고 있었다. 할머니는 단순히 음식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정과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다.

#3
기일을 이틀 앞둔 저녁, 민지는 모아온 기억의 조각들을 가지고 부엌에 섰다. 박 씨 할머니가 말한 ‘장독대의 무언가’는 다름 아닌 할머니가 직접 담근 묵은지 국물이었다. 김 씨 할아버지의 태양초 고춧가루, 최 씨 아주머니의 표고버섯 밑동, 그리고 여러 어른들의 증언을 종합해 얻은 ‘집된장과 시판 된장의 황금 비율’, ‘마지막에 넣는 들깻가루 한 스푼’까지.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재료들을 하나씩 냄비에 넣고 정성껏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듯 낯선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다. 마지막으로 들깻가루를 넣고 불을 끄자, 정말 할머니의 된장찌개와 비슷한 향이 피어올랐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맛보았다.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찌개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깊고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끝 맛, 그리고 혀끝에 감도는 따스함. 눈물이 핑 돌았다. 단순히 레시피를 복원한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정성, 그리고 할머니를 향한 자신의 그리움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맛이었다.

#4
할머니 기일 날, 민지는 자신이 끓인 된장찌개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레시피 복원에 도움을 주신 어른들을 모두 초대한 자리였다. 어른들은 민지가 끓인 찌개를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아이고, 민지야. 이거 정말 네 할머니 솜씨랑 비슷하다야!”
“그래, 이 맛이었지. 이 맛이야.”
“고생했다, 아가씨. 덕분에 오랜만에 옛날 생각 실컷 했네.”
어른들은 찌개 한 그릇에 담긴 할머니와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완벽한 레시피 재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할머니의 된장찌개는 단순히 맛이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과 정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민지는 어른들의 기억과 자신의 노력이 담긴 레시피를 수첩에 정성껏 옮겨 적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 - 민지 버전’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노을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소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 집단 기억 (Collective Memory)과 사회적 정체성: 민지가 할머니의 레시피를 복원하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추억 찾기를 넘어,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집단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각기 다른 이웃들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레시피)를 완성해나가면서, 참여자들은 과거의 공유된 경험(할머니와의 관계, 함께 음식을 나누던 기억)을 재확인하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음식이란 매개체는 강렬한 감각적 기억을 동반하기에 집단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 애도 과정과 지속적 유대 (Continuing Bonds): 민지가 할머니의 레시피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할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유대 이론'에 따르면, 사별 후 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유대감을 지속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상징과도 같은 된장찌개를 재현함으로써 할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슬픔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타주의 (Altruism)와 상호 호혜성 (Reciprocity): 마을 어른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민지에게 기꺼이 기억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은 이타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물질적 도움(맛있는 음식, 따뜻한 말 등)에 대한 기억이 상호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민지를 돕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내의 정서적 빚을 갚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 세대 간 전승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과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이 소설은 할머니 세대의 지혜와 문화(음식 레시피와 그 안에 담긴 정)가 손녀 세대로 전승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막막함을 느꼈지만, 주변의 도움을 통해 조각난 정보들을 통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경험합니다. 레시피 복원의 성공은 민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역사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