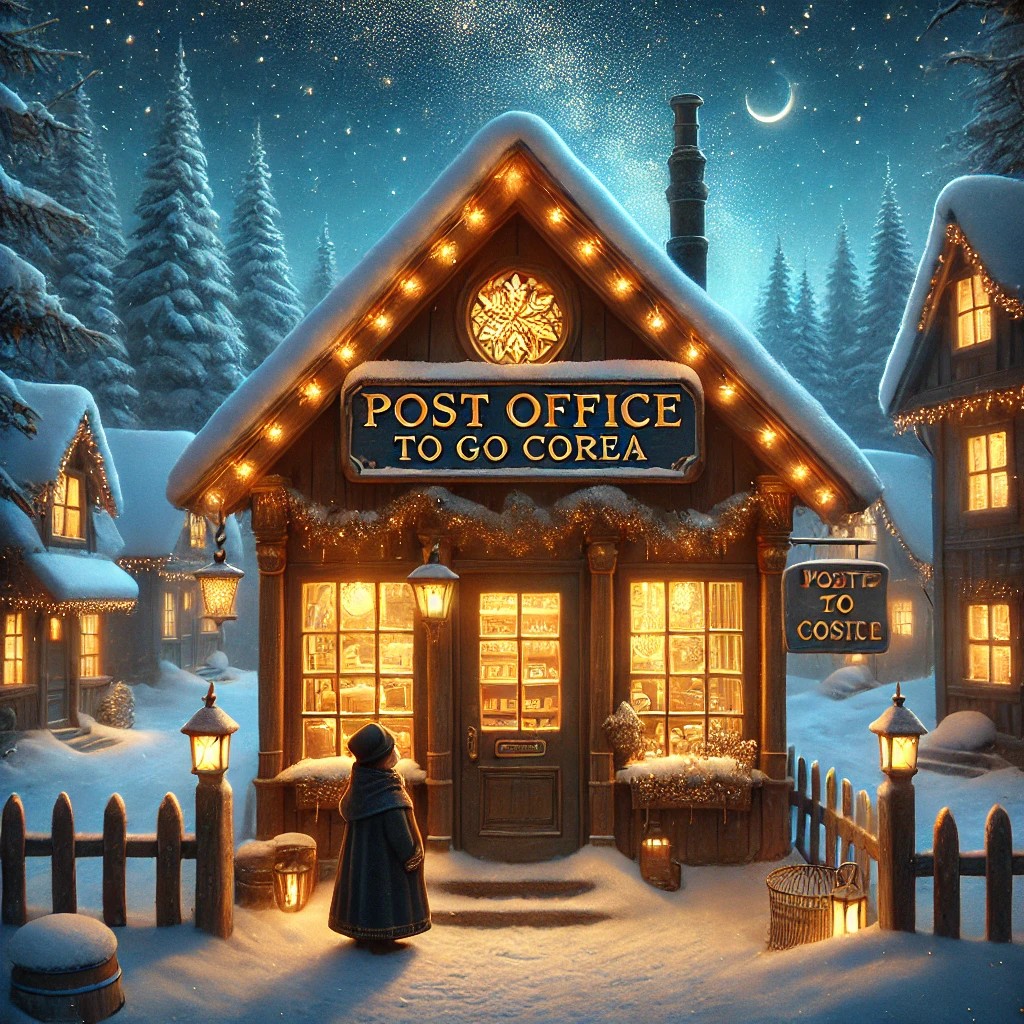민준의 세상은 가로세로 몇 미터 남짓한 무균실 안이 전부였다.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에게 바깥세상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가득한 위험지대일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병원 중앙 정원이 보였고, 그 너머에는 소아 병동의 통유리로 된 놀이방이 마주 보였다.
그곳에서 수아를 처음 보았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인 듯했다.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띤 그녀는 민준의 잿빛 세상에 떨어진 한 방울의 수채 물감 같았다.
매일 오후 3시, 민준은 약속처럼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수아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맞은편 창가에 앉은 민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며칠 뒤에는 그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민준의 멈춰 있던 심장이 오랜만에 세차게 뛰었다.

그들의 소리 없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준은 태블릿에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다. 웃는 그녀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수아는 동화책의 그림을 펼쳐 보여주거나,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화답했다. 단 한 마디의 말도, 단 하나의 소리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민준은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고열과 통증으로 온몸이 꺾일 듯 아팠다. 의사는 또다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말을 흘렸다. 캄캄한 절망이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마침 수아가 그곳에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그녀를 보자, 민준은 울컥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차가운 유리창 위로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단 한 번이라도 저 온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절박한 소망이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오더니, 민준의 손바닥이 닿은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손을 포개듯 마주 대었다. 두께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유리가 두 사람의 손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민준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이 유리창을 넘어 자신에게 전해져 오는 것을. 그날 이후, 유리창에 손을 맞대는 것은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들은 말없이 손을 맞대며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수아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녀가 있던 놀이방은 텅 비었고, 민준의 세상은 다시 빛을 잃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창가에 섰지만, 그녀의 빈자리는 절망의 크기만 키울 뿐이었다. 그는 수간호사를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다.
"저… 혹시 소아 병동에 오던 자원봉사자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수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수아 씨요… 그분, 사실 봉사자가 아니에요. 이 병원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던 환자였어요. 몸이 괜찮은 날만 아이들 보러 갔던 건데… 얼마 전부터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민준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이었다니. 그녀 역시 유리창 저편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맞대어 주었던 손바닥의 온기는,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온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기적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다. 몇 달 뒤, 민준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지긋지긋한 무균실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문이 열리던 날, 민준은 바깥 공기를 마시는 대신 곧장 중환자실 면회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보다 훨씬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여전히 햇살 같은 미소를 띤 수아를 마주할 수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수아의 병실은 여전히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민준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유리창에 손을 댔다. 수아도 희미하게 웃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힘겹게 다가와 손을 마주 대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식 순서가 잡혔습니다. 오늘 밤 수술 들어가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아의 병실 문에 붙어있던 '면회 금지' 팻말이 떨어졌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수아는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다가서는 것을 느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그녀의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수아가 가만히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유리 위로 겹쳐지던 온기가 아니라, 서로의 살결 위에서 살아 숨 쉬는 진짜 온도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유리창 너머로 나누었던 수많은 마음들이, 비로소 진짜 온도를 찾아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소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 비언어적 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의 힘: 민준과 수아의 관계는 전적으로 비언어적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표정, 제스처(손 흔들기), 상징(그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촉각적 상징 행위(유리창에 손 맞대기)를 통해 두 사람은 언어를 초월한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신호가 감정 전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연상시킵니다. 물리적 장벽(유리창)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장벽 때문에 오히려 더 애틋하고 강력한 감정적 교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상호적 이타주의 (Reciprocal Altruism):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민준은 그림으로 그녀에게 기쁨을 주고, 수아는 미소와 격려로 화답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호적 이타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안녕을 돕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관계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리적 구원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 희망 이론 (Hope Theory): 심리학자 스나이더(Snyder)의 희망 이론에 따르면, 희망은 목표(Goal), 경로(Pathways), 동인(Agency)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민준에게 '수아와의 만남'은 생존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넘어선 구체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녀와의 비언어적 교감은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으며, 그녀가 자신과 같은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병을 이겨내려는 강력한 의지, 즉 '동인'을 부여합니다. 수아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삶에 대한 희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